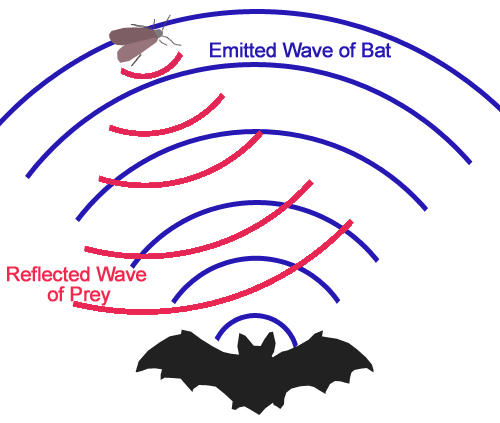“What is it like to be a bat?”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 박쥐 논증은 위키백과에 개별 항목으로 등재되기도 한 의식에 관한 직관적이고 훌륭한 사고실험이다. 이 논증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의식의 주관성, 동물의식에 대한 시사점 등에 관해 알아보자.
An organism has conscious mental states if and only if there is something that it is like to be that organism – something that it is like for the organism to be itself. ([1] 논문 본문)
Consciousness is what makes the mind-body problem really intractable.
Perhaps that is why current discussions of the problem give it little attention or get it obviously wrong.
의식이야말로 심신 문제를 풀 수 없게끔 한다.
심신문제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서 의식이 거의 무시되거나 명백히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1] 논문 본문 첫 두 문장)
의식의 환원 불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의 의식 연구가 AI로 대두되는 환원주의 및 계산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처음 꽃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찰머스의 “Hard problem”도 결국 이러한 문제의 정교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네이글은 결국 불가지론에 도달하였지만, 사실 의식 연구에 있어서 환원적, 과학적 방법론을 쓰는 걸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도 생각한다. 그것 외엔 뭘 할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명상과 같은 몇가지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뚜렷한 paradigm shift를 만들지는 못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다. 천국과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원론자dualist이고, 무신론자 혹은 과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물리주의자나 유물론자materialist가 되기 쉽다. 불교를 믿는다면 유심론자idealist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의식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 유물론자였다. 영혼은 미신이라고 굳게 믿었고, 뇌 속에 이다지도 큰 미스테리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의식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또 있을까.
[1] Nagel, Thomas.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e philosophical review 83.4 (1974): 435-450.
[2] Shen, Yong-Yi, et al. “Parallel and convergent evolution of the dim-light vision gene RH1 in bats (Order: Chiroptera).” PLoS One 5.1 (2010): e8838.